
“만화방이 무슨 대단한 사업이라고 인터뷰를 해요”라며 손사래 치던 정미선(46) 사장은 잠시 뒤 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문 열어 놓으면 손님 올 거고 그러면 먹고는 살겠지’ 하고 덤볐다가 퇴직금이나 창업자금 날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다”며 “만화방 운영에 필요한, 작지만 중요한 노하우들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역 2번 출구에서 채 50m도 안 떨어진 곳, 평범한 연립주택 건물 지하에 있는 24시간 만화카페 ‘현이와 양이’에서 정 사장은 27년 만화방 경영의 노하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99㎡(30평) 규모의 이 가게에서 정 사장은 월 매출 1300만원을 올린다.
정 사장의 사업 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에는 이를 실천할 섬세한 노하우들이 접목돼 있다.

두 번째는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기’다. 이 단계에서는 손님을 향한 정 사장의 배려심이 곳곳에 묻어난다. 30여 개 소파는 팔걸이가 널찍한 제품을 들여 옆 사람과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각 소파마다 2층짜리 작은 탁자를 앞에 뒀다. 아래쪽엔 발을 뻗어 올릴 수 있고 위칸에는 뽑아온 책을 올려 놓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 좌석 배열도 특이하다. 모르는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모든 소파가 안쪽 벽면을 보도록 한 방향으로 배치했다. 잠이 부족한 인근 직장인들을 위해 뒤로 완전히 젖혀지는 사우나식 의자 6개를 갖췄고, 눈이 침침한 장년층 독자를 위해 도수가 다른 돋보기도 2개 비치했다. 다른 가게와 달리 라이터·커피·사탕·녹차·둥굴레차도 무료로 서비스한다. 자판기를 카운터에서 안 보이는 쪽에 배치한 점도 색다르다. 정 사장은 “손님들이 주인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달 커피믹스 값으로 10만원, 6개월마다 라이터 1000개 값으로 12만원씩 목돈이 들어가지만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공짜 커피 이상의 가치를 돌려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밖에 데이트족들이 서로 머리를 기대고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가운데 팔걸이가 없는 2인용 소파를 둔 것, 여성 고객을 위한 무릎 담요, 남자친구가 만화 볼 때 심심하지 않도록 만든 여성용 잡지 진열대, ‘나는 이쑤시개입니다’라고 직접 써 붙인 이쑤시개통, 끈적끈적하게 잘 까지지 않는 사탕 대신 금세 입에 넣을 수 있는 고급 사탕을 비치한 것 등도 손님을 편하게 모시기 위한 작은 장치들이다. 정 사장은 “이 가게에 오는 손님은 누구든지 최대한 편안하고 즐겁게 있다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뭐든 준비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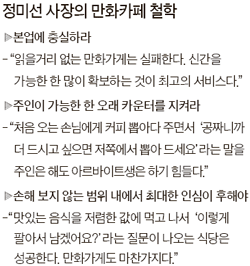
정 사장은 어렸을 때부터 만화 매니어는 아니었다. 고교 졸업 후 대전의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사표를 냈다. 다니기 싫던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전화가 계속 오자 피신하려고 간 곳이 주택가 인근의 한 만화방이었다. 1985년, 그러니까 갓 스무 살 때였다. 거기서 처음 접한 만화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다 못 보고 빌려가는데 주인이 이름도 전화번호도 안 묻고 빌려주는 게 신기했다. ‘안 갖다 주면 어쩌려고….’ 그런 생각이 들수록 미안해서라도 더 갖다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이 만화방 단골이 된 뒤 직접 경영하게 됐다. 정 사장이 손을 대면서 가게가 번창하자 하루는 다른 만화방 주인이 찾아와 “가게를 바꾸자”고 했다. 정 사장은 바꾼 만화방을 다시 크게 키운 뒤 대전역 인근으로 진출했다. 대전역에서 성공을 거둔 뒤엔 인천 주안에 있는 한 가게를 인수했다. 손님이 없어 문 닫을 지경이던 이 만화방에 손님이 몰리자 하루는 건물 주인이 찾아왔다. 그는 “전 주인이 만화 산업은 이제 죽었다고 하더니 그게 아닌가 봐”라며 직접 경영해볼 뜻을 비쳤다. 현이와 양이 인수 전까지 네 번 만화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정 사장은 한 번도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지만 ‘팔지 않겠느냐’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리를 내줬다. 정 사장은 “큰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장사라 최소한의 권리금과 실제 들어간 시설비 정도만 받고 넘겼다. 나는 다시 창업해도 성공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7년간 쌓인 깨알 같은 만화방 운영 노하우를 듣고 일어서는 기자에게 정 사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만화가게요, 안 죽었어요. 하기 나름입니다.”